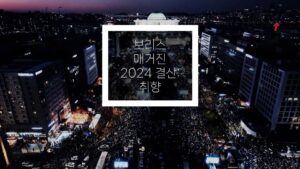대한민국 영화 역사상 전무후무한 흥행 기록을 세운 <명량>에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스스로 자신의 죽음을 입에 올린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려면)내가 죽어야겠지”라는 대사였는데, 물론 이 작품을 본 우리 모두는 그가 명량해전에서 전사를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영화도 보기 전부터) 아주 잘 알고 있다.
대신에 이순신 장군이 실제로 전사한 전투, 노량해전이 영화로 나온다고 했을 때 그의 마지막이 과연 어떻게 그려질지 많은 이들이 궁금해했던 것도 당연한 사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감독의 선택은 영리했고, 무엇보다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위인에 대한 배려가 돋보이는 헌사였다고 생각한다. ‘충무공 유니버스’의 장대한 마무리는, 주인공의 죽음으로 그렇게 완성되었다.
<노량: 죽음의 바다>(이하 <노량>)는 이전의 두 작품과 비교하면 여러 모로 다른 느낌이다. 일단 전작들에선 아예 나오지 않았던 장군의 상상 속 장면이 나온다. 그가 가장 사랑했던 셋째 아들 면이 왜군의 손에 목숨을 잃는 모습, 그리고 치열했던 전란의 와중에 진작 전사한 전우들의 생전 모습이 나오는데 해당 장면 직후에는 각각 실제 노량해전에서도 그렇고 영화 <노량> 자체에서도 그렇고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존재한다. 그 분기점이란, 이 전쟁을 끝까지 밀어붙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득(아들의 사망)하는 지점과 끝끝내 이순신 장군이 전사(전우들의 환영)하는 지점이다.
3부작의 핵심이기도 한 전투 장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작들과 사뭇 다른 접근법을 택했다. <명량>의 경우 물살을 지혜롭게 이용하는 뛰어난 지략이 돋보였고 <한산>에선 ‘바다 위의 성(城)’으로 구현된 학익진과 그 과정의 빌드업(그 와중에 거북선은 마치 살아 숨쉬는 생명체, 왜군들이 부르는 이름인 바다괴물 ‘복카이센’처럼 보이기까지 한다)이 대단한 스펙터클로 작용했다.
요컨대 <명량>과 <한산>에선 무엇보다도 전승의 카타르시스가 빼어났다는 것. 반면 <노량>은 3부작 중 전투 장면에 가장 긴 러닝타임을 할애하면서도(실제 노량해전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전투 장면 대부분은 시간적으로 야간이다. 거의 100분에 달하는 야간전 장면 또한 모르긴 몰라도 한국 영화 사상 처음 아닐까?) ‘예정된 결말’ 때문인지 다소 허무함마저 느껴진다.

아, 여기서 말하는 허무함이란 영화가 허무하다는 게 아니라 전쟁 자체가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 임하면서 스스로를 사실상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하는 일부의 시각도 나름 설득력을 갖게 된다(다만 개인적으론 그런 시각에 완전히 동의하진 않는 편이다. 이에 대해선 뒤에 더 자세히 이야기하기로 한다). 앞서 이야기했듯 전란의 와중에 모친과 아들을 잃고, 많은 전우들도 잃었으며, 억울한 모함을 받아 옥살이까지 했으니.
평범한(?) 사람이라면 저 일들 중 하나만 겪어도 이미 평정을 잃을 상황.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배우의 연기에 대해 논하자면, <명량>의 최민식과 <한산>의 박해일에 비해 <노량>의 김윤석은 아마도 캐릭터 해석에 더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말하자면 연기가 그만큼 어려웠을 거라는 이야기. 물론 배우의 연기 자체를 계량화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하물며 그 대상이 대한민국 시민이라면 모르는 이가 없는 ‘이순신’이라면) 목숨을 건 전투에서의 승리와, 그 이면의 인간적 회한까지 담아내려면 당연히 그 난이도는 매우 높았을 것으로 여겨 마땅하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최민식, 박해일, 그리고 김윤석 모두 능력 있는 배우들이고 각각의 작품에 각각 잘 녹아 들었다고 생각한다. 이목구비에서 느껴지는 전체적인 인상은 단연 <명량>의 최민식이 압도적이고, 차분한 눈빛 속 정중동을 잘 표현한 <한산>의 박해일도 뛰어났으며, 전장에서 잔뼈가 굵은 과묵한 노장의 모습은 <노량>의 김윤석이 탁월했다.
반면 왜군 적장인 시마즈 역의 백윤식은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외모에서 풍기는 포스가 엄청났지만 뭔가 무게만 잡다 끝난 느낌이랄까. 바로 그 점에서 전작 <한산>의 와키자카 역 변요한의 (눈빛)연기가 정말 빼어났다는 점을 되새길 수 있었다.

앞서 언급했듯 거의 100분이 넘어가는 전투 장면이 펼쳐지다가 동이 터올 무렵 벌어지는 백병전의 롱테이크 장면은 <노량>의 백미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주인공의 죽음이라는 예정된 결말이 있는 만큼 스펙터클의 쾌감에 집중하기보단 이름 모를 많은 병사들이 스러져간 비애감을 조명하는 편이다.
마지막으로 덧붙이는 이야기. <노량>은 7년간 이어진 전쟁 자체에 대한 회의(懷疑)를 화두로 던지며 초반을 시작한다. 전쟁을 시작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철군의 유언을 남겼고, 조명연합군 중 명의 도독 진린은 노골적으로 전쟁에서 발을 빼고자 한다. 최전선의 고니시에게는 적장이기도 한 진린에게 뇌물까지 바치면서 한시라도 바삐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절박한 이유가 있으며, 조선 왕실에선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암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순신 장군이 목숨까지 바친 이 전투는 과연 꼭 필요한 전투였을까? 그가 “열도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완전한 항복을 받아내야 한다”고 이야기한 진짜 이유가, 정말로 이번 전란과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을까? 적어도 김한민 감독은 그렇게 생각하는 듯하다. “싸움이 급하니, 내 죽음을 내지 마라”고 한 장군의 마지막 전언을 그대로 시각화한, 북을 이용한 독전(督戰) 장면은 거의 10년에 걸쳐 이어진 ‘충무공 유니버스’의 완벽한 마침표라고 할 만하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극이 계속 만들어지는 이유는 과거의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고자 함이라고 한다. 인류가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한 이래 세상에 전쟁이 없었던 적이 거의 없었다고 하지만, 2024년의 세상에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도 벌어지고 있고 지구 반대편에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도 벌어지고 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 또한 휴전 상태이지 않은가. 이 땅에 다시는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목숨까지 바친 이순신 장군의 신념을 지금의 우리가 올바르게 받아들이는 자세는 어떤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