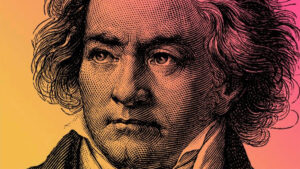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무력 침공을 감행한 것이 지난 2월의 일이다. 9개월이라는 ‘까마득한’ 시간이 흐르는 동안 38,000여 명이 사망을 했고, 53,000여 명이 다쳤다. 1,360여 만 명이 집도 절도 없이 떠도는 난민이 되었고, 피해액은 최소 수십 조에서 최대 1천 조에 달하는 걸로 집계되고 있다.
도대체 이 전쟁 그 어디에, 그토록 숭고하다고 외치는 명분이 있을까? 이 전쟁 그 어디에, 그토록 중요하다고 외치는 가치가 있을까? 이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전쟁에 책임이 있는 자들은, 1백 년 전의 교훈으로부터 그 어떤 가르침도 얻지 못했다는 점이 명백하다. 그래서 <서부전선 이상 없다>를 보는 내내 착잡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서부전선 이상 없다>는 전쟁의 참상을 고발한 반전(反戰) 문학의 백미로 꼽히는 동명의 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이다. 사실 그 원작은 워낙 유명한 탓에 할리우드에서 두 번이나 영화화가 되었고 그 중 1930년에 나온 작품은 지금까지도 전쟁영화의 ‘정전’으로 추앙을 받고 있다.
정전: 正典, Kanon / 우리나라에선 영어식 표현을 빌어 Canon으로 많이 쓰지만 본 글에선 원작 자체가 독일어로 쓰여진 만큼 이에 대해 헌사를 바치는 의미에서 굳이 독일어인 Kanon이라고 쓴다.
다만 한 가지 특이한 점이라면, 원작이 그렇게 많이 알려졌는데도 정작 작가인 에리히 마리아 레마르크의 고국인 독일에서 영화화 작업이 이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또한 본작은 진작 독일에서 만들어지고 각종 영화제에 초청되어 호평을 받은 작품에 대해 넷플릭스가 전 세계 배급권을 획득하면서 비로소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가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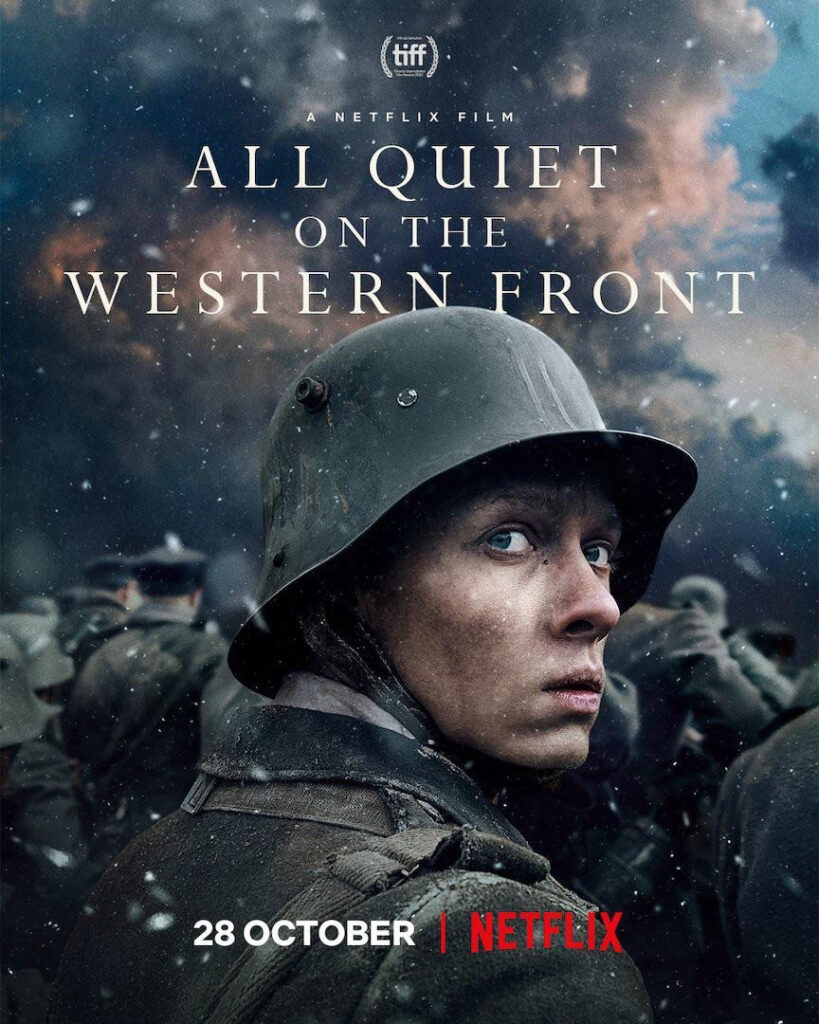
원작 소설로부터 일부 각색이 되었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에서 크게 달라진 부분은 별로 없다. 무엇보다 이제 최전선에 막 투입된 일개 병사(그것도 패전국인 독일군 병사)의 시각을 통해서 참혹한 전쟁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진다. 전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적과 싸우는 게 아니라 참호에 고인 물을 퍼내야 하는 일이고, 압도적인 프랑스군의 전차와 화염방사기에 온몸으로 맞서야 하며, 명예욕에 눈이 먼 장군의 명령에 따라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려야 하는 등의 광경이 생생하게 그려진다. 그 와중에 ‘어쩔 수 없이’ 적군의 병사를 살해한 후, 그 시체와 뒤엉켜 안절부절 하는 장면은 정말 오래 기억에 남게 된다(이 장면은 원작에서도 그대로 나온다고 한다).
기왕 이야기가 나왔으니 원작(과의 비교)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본작 <서부전선 이상 없다>가 원작소설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휴전 협상을 하는 정치인들이 직접 등장한다는 점이다(원작소설은 마지막 부분의 일부만 제외하고 전체 분량 대부분이 주인공인 파울의 1인칭 시점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
물론 시나리오 작가가 그와 같은 선택을 한 이유는, 전쟁의 참상을 보다 더 극적으로 그리기 위함일 것이다. 실제로 (독일 입장에선 굴욕적일 수밖에 없는)휴전 협정 문서에 직접 서명을 하는 정치인은 자신의 아들을 전장에서 잃었다는 설정을 포함하고 있으니. 그리고 연출의 측면에서도 전장에서 구르는 병사들과 고위 정치인들은 여러 모로 대비되는 모습을 보인다. 병사들의 경우는 넓은 평원, 그러니까 수평적인 공간이 배경에 자주 놓이는 반면 정치인들은 침엽수가 빽빽하게 들어찬 숲 같은 수직적인 공간을 배경으로 자주 등장한다. 병사들은 적군이 먹다 남긴 빵 부스러기를 게걸스럽게 먹어 치우고 있는 와중 정치인(+ 장군)들은 고급 요리를 즐기는 모습 같은 건 말할 것도 없고.
유독 전쟁영화 장르에서 자주 보게 되는, 참 식상해진 장면들이 있다. 예컨대 주인공과 가장 친한 전우가 아리따운 여자의 사진을 보여주며 “예쁘지? 전쟁이 끝나고 고향에 돌아가면 청혼을 할 거야” 같은 대사를 하게 되면 거의 100% 그 전우는 전사를 하게 된다는(그것도 바로 주인공의 눈앞에서!) 거나, 계급은 주인공과 같거나 거의 비슷하지만 나이는 한참 많아서 주인공을 이것저것 챙겨주는 듬직한 형님 캐릭터(그리고 이런 캐릭터도 십중팔구 전쟁 끝나기 직전에 전사한다)가 나오는 거나, 이제 진짜 전쟁의 마지막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사실상 목숨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위험한 작전에 투입되는 것 등등.

그런데 놀라운 건, 위와 같은 전쟁영화 장르의 클리셰들 중 다수가 바로 <서부전선 이상 없다>의 원작에 실제로 나온다는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1백 년 전(원작의 출간은 1929년이다)에, 이처럼 보는 이의 심금을 울리는(‘알고도 당하는’) 장치를 문학에서 구현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지 않은가? 바로 그래서 원작이 정전, Kanon으로 추앙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런 원작을 바탕으로 한 본작 <서부전선 이상 없다> 또한 마땅히 수작으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덧붙이는 말. <서부전선 이상 없다>를 보고 나니 자연스럽게(?) 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또 다른 영화, <1917> 생각이 날 수밖에 없었다. 당연하지만 두 작품은 서로 다른 진영(독일군과 영국군)에서의 시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참 희한하게도 두 작품에 나온 주인공이 참 비슷하게(?) 생겼다는 느낌을 준 것. 어쩌면 아무것도 모르는 순박한 젊은이가 전쟁으로 멍들어가는 모습을 더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좀 어리숙한 외모의 배우를 캐스팅한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들 정도. 지금으로부터 1백 년 전, 유럽 전선에는 약 900만 여 명의 젊은 피가 뿌려졌다. 그리고 1백 년이 흐른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선에선 또 얼마나 많은 ‘파울’과 얼마나 많은 ‘조지’(혹은 ‘윌리엄’) 들이 안타까운 희생을 강요 받고 있을까. 이 미친 전쟁을 반드시 멈춰야 한다. 지금 당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