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장이란 애시당초에 글러서, 해는 아직 중천에 있건만 장판은 벌써 쓸쓸하고 더운 햇발이 벌여놓은 전 휘장 밑으로 등줄기를 훅훅 볶는다. 마을 사람들은 거지반 돌아간 뒤요, 팔리지 못한 나뭇군패가 길거리에 궁싯거리고들 있으나 석윳병이나 받고 고깃마리나 사면 족할 이 축들을 바라고 언제까지든지 버티고 있을 법은 없다. 춥춥스럽게 날아드는 파리떼도 장난군 각다귀들도 귀치않다. 얽둑배기요 왼손잡이인 드팀전의 허생원은 기어코 동업의 조선달에게 낚아보았다.

한국 근대문학사를 논함에 있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빛나는 성취. 이효석 작가의 <메밀꽃 필 무렵>은 하필이면(?) 같은 해(1936년)에 소개된 김유정 작가의 <동백꽃>, 이상의 <날개> 등과 함께(도대체 1936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오랜 기간 동안 바로 그런 평가를 받을 것이 자명하다.
중학교 때였는지 고등학교 때였는지 확실치는 않은데, 하여튼 당시 국어교과서에 실린(요즘도 있는지?) <메밀꽃 필 무렵>을 보고는 무척 강렬한 인상을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당시 교과서에는 전문이 다 실려있진 않았던 기억도 있고, 그래서 굳이 시립도서관에 가서 전문이 실린 책을 찾아봤던 기억도 있다. 문과 출신이라 한국의 근대/현대 문학 사조에 속하는 작품들을 여럿 보긴 했는데 <메밀꽃 필 무렵>에 대한 나의 인상은 정말이지 특별한 것이었다.
사실 까까머리 시절엔 나 스스로도 이 작품에 대한 인상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하긴 힘들었다. 그저 ‘꽤 재미있는 단편소설이구나’ 정도가 당시에 가졌던 생각이었을 터. <메밀꽃 필 무렵>이 왜 나에게 그리도 깊은 인상을 남겼는지 그 이유는 나이를 조금 먹고 나서야 알게 된 듯하다.
길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 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 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붓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일단 <메밀꽃 필 무렵>은 시각적 묘사가 정말 탁월하다. 당대의 다른 그 어떤 작품과 비교해도 모자람이 없는 정도. 특히 달빛이 훤한 밤에 허생원이 동이와 함께 터벅터벅 길을 걸어가는 장면의, ‘흐붓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란 묘사는 정말 다시 없을 멋진 표현이라 생각한다. 물론 김유정 작가의 <동백꽃>이나 <봄봄>, 그리고 현진건 작가의 <운수 좋은 날> 등의 작품에도 멋진 표현은 많이 나오지만 그 작품들의 특징은 주로 내러티브(혹은 상황) 자체와 캐릭터에 주의가 집중되는 반면 시각적 심상을 구현하는 측면에선 아무래도 <메밀꽃 필 무렵> 쪽에 기우는 것이 사실(개인 취향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메밀꽃 필 무렵>은 열린 결말을 보여주고 있다. 특정한 이야기로 이루어진 콘텐츠에서 바로 그 이야기를 명확하게 끝맺지 않는 열린 결말은 콘텐츠 소비자에 따라 호불호가 심하게 갈리는 요소인 것은 사실이다(평론가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이야기가 훌륭하게 구성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열린 결말’이란 요소 때문에 종종 갑론을박이 이어지곤 한다).
그렇긴 한데 <메밀꽃 필 무렵>에서의 열린 결말은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다. 어느 모로 보나 동이는 허생원의 아들이 맞는데(혹시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 따라 나오세요 ^^), 적어도 허생원은 그 사실을 눈치챘지만 집도 절도 없이 드팀전을 떠도는 장돌뱅이 신세에 어찌 새끼를 거두겠는가? 게다가 그 아들은 현재 자신과 같은 신세. 비록 하룻밤 풋사랑으로 생긴 아들이라지만 어디서든 잘 먹고 잘 살고 있기를 바라는 게 아비 마음 아니겠는가? 그런 상황에서 동이가 자신의 아들임을 받아들이기를 주저하는(그럴 수밖에 없는) 허생원의 페이소스가, 바로 <메밀꽃 필 무렵>의 열린 결말에 깃들어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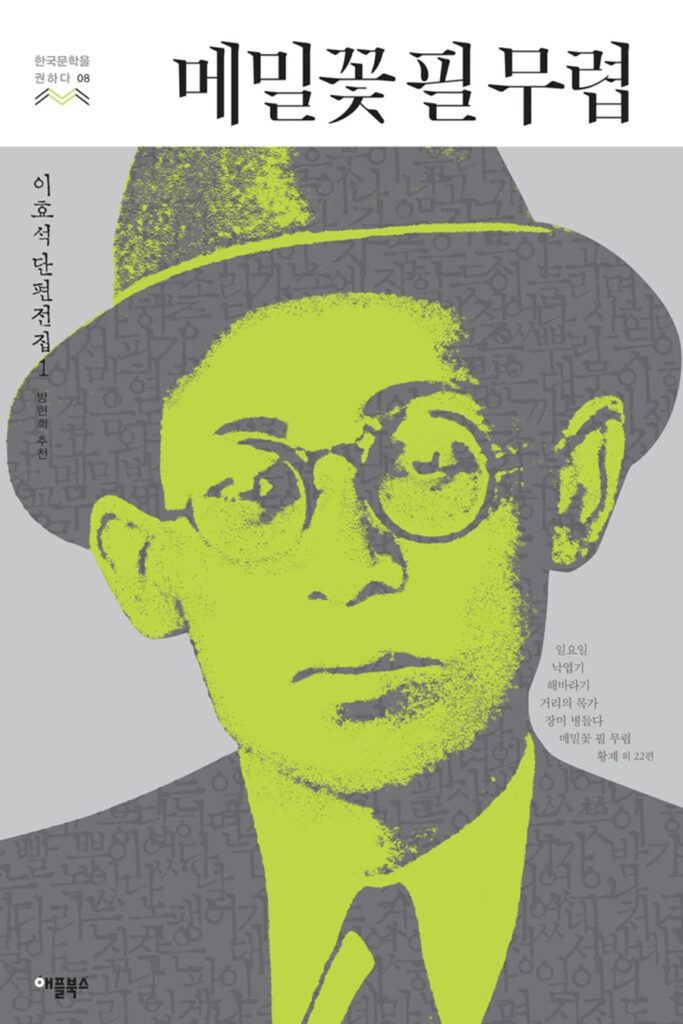
그렇다고는 하여도 꼭 한번의 첫 일을 잊을 수는 없었다. 뒤에도 처음에도 없는 단 한번의 괴이한 인연! 봉평에 다니기 시작한 젊은 시절의 일이었으나 그것을 생각할 적만은 그도 산 보람을 느꼈다.
“달밤이었으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지금 생각해도 도무지 알 수 없어.”
허생원은 오늘밤도 또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려는 것이다. 조선달은 친구가 된 이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다. 그렇다고 싫증을 낼 수도 없었으나 허생원은 시치미를 떼고 되풀이할 대로는 되풀이하고야 말았다.
“달밤에는 그런 이야기가 격에 맞거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메밀꽃 필 무렵>을 워낙 좋아해서, 바로 그 작품의 배경이 된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에 위치한 이효석 문학관을 두 번이나 간 적이 있다(처음 갔을 땐 비가 워낙 많이 내리는 날이어서 구경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작가와 작품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는 걸 본 기억이 난다. 그런데 그것도 벌써 거의 한 10년도 전의 일.
원래 딱 요맘때, 그러니까 9월 초순이면 봉평 일대에 메밀꽃이 흐드러지게 핀다고 한다. 그리고 아마 실제 작품도 9월 초순을 전후로 한 때를 배경으로 했을 것. 그러니 작품 속에서도 그런 묘사가 가능했겠지. 다만 아쉬운 것은 원래 매년 9월 초순이면 이효석 문학관 일대에선 <메밀꽃 필 무렵>을 주력 콘텐츠로 하는 ‘효석문화제’가 열리는데 올해는 열리지 못한다는 것. ㅠㅠ
한동안 전국 여러 지역에서 열렸던 다양한 축제가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거나 연기되다가 올해 들어선 일부 지역에서 예전보단 다소 작은 규모로 열리기 시작해서 기대감을 갖게 했는데 아무튼 올해는 취소라고 한다. 지난 2019년 이후 3년째 열리지 못하고 있는 효석문화제를 부디 내년에는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추석 연휴를 앞둔 9월 둘째 주에 <메밀꽃 필 무렵>을 소개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한 수해가 어느 정도 복구되면, 오랜만에 강원도에 다시 한 번 가볼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