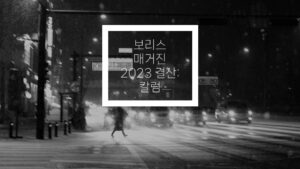2024년을 기준으로 연배가 대략 40대부터 60대 정도에 해당하는 중년 이상의 세대가 대학에 다닐 무렵의 일이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30년 정도 전의 일이란 얘기. 당시엔 대학생 자체가 많지 않아서 그저 어떤 대학이든 멀쩡하게(?) 졸업만 하면 원하는 기업에 쉽게 취업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 그 옛날에도 대기업을 비롯해서 소위 S급에 속하는 직장을 얻으려면 학점은 포함해서 취업을 위한 공부도 열심히 해야 했던 것.
그래서 당시 졸업을 한두 학기 정도 남긴 대학생들 중 제대로 된 취업 준비를 하고자 했던 이들은 ‘굉장히 두꺼운’ 책을 한 권씩 구해서 보곤 했는데, 대략 <시사/상식 용어 사전> 같은 제목이 붙어있는 책들이었다. 요즘도 이런 책이 나오긴 하나? 잘 모르겠다.
이른바 ‘질 높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선 공채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이 필수였는데 당시 많은 기업들은 공채 시험에서 위에 언급한 책에 나오는 내용을 다뤘던 것이다. 시사 혹은 상식에 관련된 용어를 주루룩 설명하고 있는 그 책들은 여러 출판사에서 다양한 버전이 나왔는데, 솔직히 다루고 있는 테마 자체의 특성상 내용 자체는 거의 비슷했다.
시사/상식에 관한 용어가 가나다 순으로 나온 그런 책들의 거의 첫 부분에는 ‘게리맨더링’이란 용어가 거의 빠짐 없이 등장했다. 그 이유? 당연하지. 용어가 가나다 순으로 배열되었으니.
게리맨더링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다 서두가 길었다. 오는 4월10일 열리는 22대 총선의 선거구가 확정되었다는 소식이다. 그런데 그렇게 확정이 된 날짜는, 선거를 불과 41일 앞둔 날. 이를테면 선수가 어떤 그라운드에서 뛰어야 할지 너무 늦게 결정이 된 건데, 당연하게도 여야가 서로의 입장을 내세우며 줄다리기를 하다가 이렇게 된 것이다(덧붙이면 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선거 1년 전에 결정이 나야 한다. 22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 자체가 그만큼 늦었단 이야기).
여기에서 게리맨더링이란 용어의 뜻에 대해 살펴보자. 지난 1812년, 미국 주지사 선거에 나선 엘브리지 게리(Elbridge Thomas Gerry)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기형적으로 획정한 데서 유래한 말인데, 그 선거구를 지도에서 살펴본 모양이 흡사 모가지가 길쭉한 상상의 동물 샐러맨더를 닮았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은 것이다.
※ 샐러맨더는 서양 신화나 전설에 등장하는 파충류 형태의 동물인데, 입에서 불을 뿜으며 그 자체가 불의 정령을 상징하기도 한다. 우민화 정책이 극에 달하면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책을 불로 태워버린다는 내용의 디스토피아 SF <화씨 451>(레이 브래드버리 作)에서 ‘방화수’(소방수의 반대가 되는 개념으로, 책을 태우는 역할을 한다)들이 사용하는 화염방사기에 바로 방화수의 상징인 샐러맨더가 양각으로 새겨져 있다.

우리나라는 원래 땅덩어리가 작기 때문에 이번 22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 문제도 미국의 원조(?) 게리맨더링에 비하면 뭐 그렇게까지 기형적으로 보이진 않는다. 다만 총선은 물론이고 지선, 대선 같은 선거에서 선거구는 무척 중요한 것만은 명백한 사실. 선거구는 크게 두 가지 요인에다가 국회의 정무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데, 그 요인은 ▲ 인구 수(유권자 수) ▲ 선거구의 면적 등이다.
우선 인구 수에 있어선 명확한 기준이 있다. 대한민국의 선거구는 인구 수 13만6600명 이상 / 27만3200명 이하에 속해야 한다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내용. 당연하지만, 인구 수는 어디까지나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선거구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요즘은 서울과 수도권, 부산/경남권, 여기에 더해 세종시 정도를 제외한 대한민국의 나머지 대부분 지방은 빠른 속도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닌가.
그리고 선거구 면적에 대해. 인구가 적다고 해서 무턱대고 선거구 면적을 늘릴 수도 없는 것이, 그렇게 되면 정당의 선거운동에 지나치게 과부하가 걸리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선거구는 강원도의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군인데, 무려 5개 기초지자체가 하나로 묶인 선거구이고 그 면적은 거의 6000 제곱킬로미터에 달한다. 이런 데서 선거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절레절레. 이런 상황은 전남 도서 지역도 마찬가지여서, 선거운동을 위해 온종일 배를 타고 이 섬 저 섬을 다니는 것이 해당 지역 후보자들의 일상.
이 외에도 여러 중요한 내용이 얽혀있는지라 현행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에선 완전한 독립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미 이번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그게 정해진 대로만 굴러가는 게 아니라는 게 여전히 제기되는 문제.
어쨌든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다. 유권자의 참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리고 유권자의 대의가 정확히 반영되도록 관련 기관은 관련 제도를 더 세심하게 다듬고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같은 일들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