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의 사진은 지난 2020년 7월의 모습이다. 당시 여당과 정부가 지역간 의료 불균형 문제 해소와 의사 수 부족을 이유로 의대 정원을 확충하여 의사를 더 많이 양성하겠다고 밝히자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던 바로 그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실제로 전국의 병원과 의원들 중엔 일주일간 파업에 나섰던 곳도 있었고, 의대생들 중엔 의사국시 보이콧에 나선 이들도 있었을 정도.
그로부터 2년여의 시간이 흐른 현재, 매우 흥미로운(?) 상황이 연출되었다. 2020년엔 야당이었던 현재의 여당, 국민의힘이 의대 정원 확대를 부르짖고 나선 것. 이번엔 여당은 물론이고 정부와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도 ‘공동전선’을 펴고 있다. 아예 “(의사 수급 불균형은)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 때문”이라며 공세 수위도 2년여 전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보다 오히려 높였다.
2020년, “대한민국의 의료 접근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진짜 문제는 낮은 의료 수가 때문에 발생하며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겠다는 생각은 정부가 쉬운 길로만 가려는 것(당시 의협 김대하 대변인의 인터뷰 中)”이라고 일갈했던 그 ‘패기’가 과연 다시 발휘될지 어떨지, 두고 볼 일이다.
그런 문제와는 별개로, 궁금한 부분이 있기는 하다. ‘대한민국에서 적절한 의사 수는 과연 몇 명일까’하는 것. 바로 지난 주에 보리스 매거진 칼럼에서 의료관광에 대해 조명하면서 언급했듯이 최근 들어 병원에 갈 일이 잦아지면서 그런 궁금증은 더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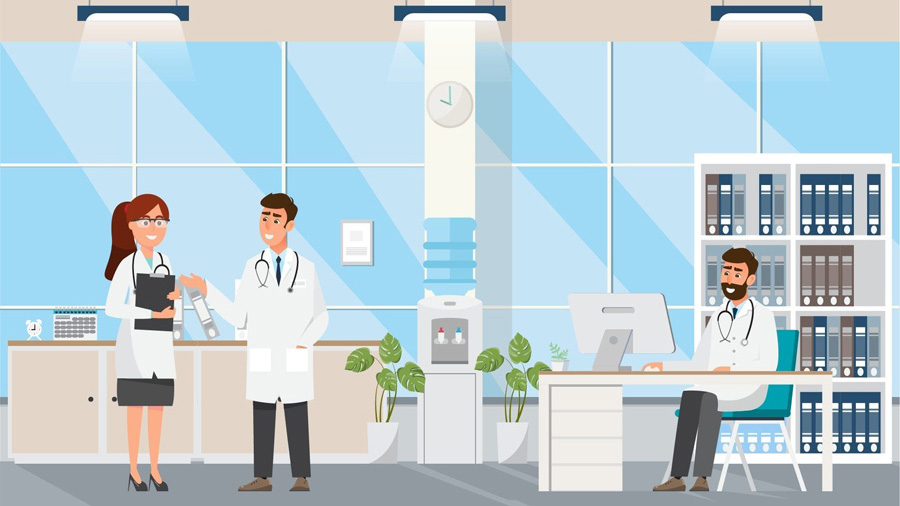
물론 ‘가장 적당한’이라고는 해도 절대적인 기준이 따로 있을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상황이나 사정에 따라 그 수는 유동적일 것이다. 이를테면 환자가 돌봐야 하는 시민들의 평균 연령이나, 평균 보유 질환 수, 생활 수준 정도에 따라서도 달리질 테고, 기타 등등.
다만 굳이 산술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하면 외국의 상황과 비교를 할 수는 있겠다. 그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의사 수는 확실히 많은 편이라고 하긴 힘들다. 국제 통계에 따르면 국민 1천명 당 활동하는 의사 수는 대한민국의 경우 2.4명으로 OECD 평균 3.4명에 비해 적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서울/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큰 편인데, 서울은 3.1명의 의사가 국민 1천명을 돌보는 와중 경북은 1.4명, 세종시는 0.9명 수준. 게다가 지방은 소아과 같은 특정 과목 전문의는 손에 꼽기도 힘들 정도다.
물론 ‘대한민국에 의사 수가 적다’고 하는 주장을 반박하는 통계자료 또한 존재한다. 예컨대 국민 1인당 연간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16.9회, 평균 입원일 수는 19.1일인 반면 OECD 평균은 연간 외래진료 수 7.1회, 입원일 수 8.2일에 달한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의료 접근성은 결코 낮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본디 칼럼이란 저자가 어떤 특정한 의견을 주장하거나,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 다양한 논거를 들며 반박하는 것이 목적이자 의의라고 하겠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적절한 의사 수가 지금보다 많아져야 하는지, 지금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하는지, 혹은 아예 더 적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릴 만한 지식을 지금의 내가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고백할 수밖에 없겠다.
다만 한 가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최근 들어 보호자로 이 병원 저 병원을 자주 다니면서 느낀 점에 대해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모든 환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병원에 가서 원하는 의사로부터 적절한 진료와 처방을 받는 일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일단 병원에 가는 것부터가 힘든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와 같은 부분은 단순한 의료 서비스로의 접근보다는 요양 혹은 복지의 차원이 강하니 그 부분에 대해선 나중에 별도의 지면을 통해 나름의 의견을 정리하여 밝힐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덧붙이면, 정말 궁금하긴 하다. 의사협회와 의대생들은, 정말 2020년에 그랬던 것처럼 그토록 진지하게 자신들의 의견(즉, ‘의대 정원 및 의사 수 확대 반대’)을 피력할 것인가? 정부나 여당이나 관계부처가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파업이나 의사국시 보이콧 같이 강력한(!) 투쟁 수단을 동원할 것인가? 그게 정~말 궁금하다. ㅎ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