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 누군가가, 듣는 사람이 꽤 민망해 할 수 있는 말을 혼자 내뱉었다. 그런데 아뿔싸, 그 광경을 그대로 촬영하고 있는 기자의 카메라가 있었던 것. 이 영상이 인터넷을 타고 퍼져나가기 직전, 그 고위 공직자를 뒤에서 케어하는 누군가가 기자들에게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읍소를 했지만 결국 공개가 되었다. 그런데 뒤이어 벌어진 일은 더 웃긴다. 그 ‘듣기 민망한’ 말을 들은 반대 진영의 사람들은 사과를 하라고 했지만 정작 그 말을 한 이의 진영에선 ‘그런 말을 한 적 없다’ 면서 영상(과 자막)에 대해 가짜라고 소리치기 시작한 것. 여기에 실제 그 말을 한 이조차 (영상이 멀쩡히 남아있는데도)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어렵다’였다)고 하는 상황이다.
시나리오도, 연출과 출연진도 모두 함량 미달인 시트콤을 보는 느낌이 바로 이런 걸까? 특정한 정보가 지구 반대편까지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그야말로 ‘발 없는 말이 천 리 가는’ 시대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슬쩍 가리고선 괜찮겠지, 라고 하는 이들과, 그런 이들을 자발적으로 지지하면서 권력을 내준 이들까지도 이렇게 많을 줄은 정말 몰랐다.
어떻게 보면 바로 이럴 때가, 고전으로 눈을 돌려볼 때. 그런 점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적자(嫡子), 토머스 핀천의 <제49호 품목의 경매>를 다시 보는 건 흥미로운 일이다. 지금의 이 우스꽝스러운 현실이, 차라리 현실이 아니라 가상이길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 지금으로부터 무려 56년 전에 가상과 실재의 모호한 경계에 주목한 대문호의 비전에 경의를 표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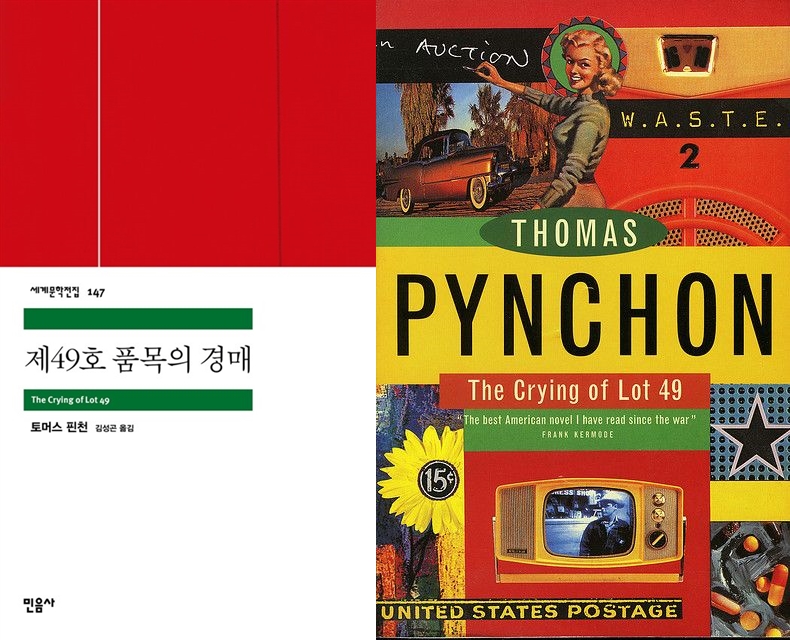
한 평범한 주부 에디파 마스가 편지 한 통을 받으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 편지는 그녀가 지금의 남편과 결혼 전 사귀었던 남자인 부동산 재벌, 피어스 인버라리티가 사망을 했으니 유산 집행을 위해 캘리포니아 인근의 샌 나르시소스로 와달라는 내용이다(작품 속 인명과 지명 등 고유명사가 상당히 희한하게 만들어진 조어/造語라는 점이 <제49호 품목의 경매>에서 매우 특이한 점이다).
에디파는 샌 나르시소스로 향하는데, 거기서 일종의 반정부 지하 단체인 ‘트리스테로’를 만나게 된다. 이들은 정부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치적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공 시스템의 대표격으로 우편 제도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그에 반발하여 소외 계층이 이용하는 ‘지하 우편 제도’를 개발하고 운영한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다.
지하 조직 트리스테로를 상징하는 나팔 문양을 따라가면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이 진짜 현실인지, 혹시 저 너머에 전혀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혼란을 겪는 에디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지하 우편 시스템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위조 우표가 ‘제49호 품목’으로 경매에 부쳐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에디파는, 만약 트리스테로가 실재하는 조직이라면 그 우표를 반드시 손에 넣기 위해 경매에 참석하여 입찰을 할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고, 경매장에서 제49호 품목의 경매를 기다린다.
거기에서, 작품은 끝. 이를테면, 열린 결말.

내용만 쭉 훑어보면 상당히 흥미진진한 스릴러 같은 느낌인데 막상 소설을 읽어보면 솔직히 난해한 편이라고 생각한다. 원래 토머스 핀천이란 작가의 작품들에 이런저런 은유가 많고 어렵기로 유명한 중에서 <제49호 품목의 경매>는 그나마(?) 좀 덜 어려운 편이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론 그리 두껍지도 않은 책을 보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다. ㅠ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이라면, 전반적인 내용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기시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 평범한 주인공이 누군가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무언가를 찾아서 떠나서는, 내가 살고 있는 현실 바깥에, 이전까진 전혀 몰랐던 또 다른 현실이 있음을 알게 되고 하여튼 현실과 허구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나중엔 주인공이 반체제 집단과 조우하게 된다는 내용까지 들으면 누구나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작품이 있을 듯하다. 바로 <매트릭스>. 아닌 게 아니라 민음사 판 <제49호 품목의 경매>를 보면 책 말미 역자 후기에 바로 이 책을 번역한 김성곤 교수가 직접 <매트릭스>를 언급하기도 한다.
다시, 글의 맨 앞에서 언급한 내용으로 돌아가보자. 원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정한 가치를 갖고 있는 정보는, 스스로 유통된다. 누군가 틀어막는다고 해서 갑자기 사라지는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 어떤 정보가 유통의 단계에서 사라지거나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히는 경우는 오로지 딱 하나. 그 정보가 더 이상 아무런 가치를 갖지 않게/못하게 된 경우다.
이런 이야기를 굳이 해줘야만 아나? 비속어 논란? 웃기는 이야기다. 논란은 A라는 의견(혹은 전제)과 B라는 의견(혹은 전제)가 맞설 때나 붙일 수 있는 단어가 아니던가. 영상이라는 증거와 실체가 명백히 남아있는데 논란은 무슨 논란. 그저 단순하고 짤막한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는 일이 자꾸 부풀려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게끔 하는 일을 ‘나서서’ 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게 웃긴다. 사람들이 자꾸 반체제적인 시각과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게 하는, 이를테면 트리스테로의 나팔 문양을 자꾸 찾게 만드는 현실이, 웃프다.



